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3편]
민생기행 – 프랑스편
– 소현민 회원
1. 서론
파리에서는 2025. 2. 19.부터 2. 21.까지 3일 동안 6곳의 기관/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① 사회주택의 공급 및 관리, 특히 재정 문제와 ② 세입자 단체에 초점을 맞춘 후, 국내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방문 단체를 구상하여 현지 코디님을 통해 4곳[CNL(전국세입자연합), ANCOLS(전국사회주택감독기관), Paris Habitat(파리 아비타, 사회주택 공기업), USH(프랑스 사회주택 공급단체 연합기관)]을 섭외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생경제위원장님의 추천으로 프랑스 사회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Fondation Jean-Jaurès(장 조레스 재단)와 헌법기구인 시민참여기관 CESE(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섭외하였습니다.

2. 첫째 날 (2. 19.) 오전 : Fondation Jean-Jaurès(장 조레스 재단)
장 조레스 재단(Jean Jaurè Foundation)은 1992년에 설립된 싱크탱크로, 프랑스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 독립된 재단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 사회주의 지도자였던 장 조레스(Jean Jaurè, 1859-1914)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 의장은 장 마크 아이로 전 총리(Jean-Marc Ayrault)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재정은 공공지원 80%, 기부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다수의 관측소(Observatoi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티에리 오브(Thierry Aube) 아시아-태평양 관측소 소장, 마야 로랑스(Maya Laurens) 국제 부서 프로젝트 담당관, 아르노 르보(Arnaud Leveau) 파리 도핀 대학교(Université Paris Dauphine) 국제 관계학 교수, 알렉상드르 미네(Alexandre Minet) 국제부 국장, 샤를리 살카자노프(Charly Salkazanov)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아르노 르보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간담회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어떠한지, 둘째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민변의 입장이 무엇인지, 셋째는 한국 정치 구조상 국회가 단원제인 점이 제도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재단 측에서는 재단의 활동과 프랑스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하고, 양국의 정치 상황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재단 소개 위주의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는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첫 교류인 만큼 다소 포괄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윤복남 회장님께서 온라인 영상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간담회 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3. 첫째 날 (2. 19.) 오후 : CNL(Confédération Nationale du Logement, 전국세입자연합)
CNL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던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단체입니다. 파리코뮌 이후 등장한 여러 세입자 단체들의 연합으로 19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양차대전 후 전국 세입자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정비되었고, 1980년에는 프랑스 정부의 주택 소유 장려 정책에 대응해 명칭에서 ‘세입자’를 ‘거주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거주 및 자가 소유자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단체들의 한 축은 지역 네트워크이고, 한 축은 사회주택 공급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세입자 대표 집단입니다. 프랑스 전역의 100여개 지역 중 87개 지역에 지역 연맹이 있고, 약 4,600개의 지역 모임이 있으며,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가구는 약 7만 가구입니다. 800명 이상의 대표자가 사회주택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NL에서는 에디 자크마르(Eddie Jacquemart) 회장, 가브리엘 무셰(Gabriel Mouchès) 사무국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CNL은 우리의 방문 일정에 맞추어 연례 정기총회 일정까지 변경하였습니다.
CNL의 최근 이슈는 임대료 인상 저항 투쟁과 사회주택 건설 확대 운동 등 2가지입니다. 지난 2년간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비가 대폭 상승하여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일어나는 등 가계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 건물주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보수(레노베이션)하면 15년 동안 레노베이션 비용의 50%를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견해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크마르 회장은 CNL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정치적 로비라면서, 주거 분야는 정치적 문제라며 로비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주자는 곧 투쟁가”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한 생활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주거가 사실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5%에 이르게 된 것도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수단이 결합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SRU법(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좌파 정부의 정책으로, 3,500명 이상의 도시에서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정부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파 정부 시기 일부 완화되어 민간임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지만, CNL은 온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회복하고 그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우선적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매권’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 확보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분리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자크마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 모델을 추구했지만, 최근에는 월 1,300유로 이하의 소득만 입주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빈민층만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입주자를 퇴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정부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극빈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만을 위한 설계는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리를 초래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즐거운 방문이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님과 최경호 박사님께서도 자리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나가셨고, 자크마르 회장도 “당신들은 재미있는 질문들만 한다”라면서 이석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4. 둘째 날 (2. 20.) 오전 : ANCOLS(Agence nationale de contrôle du logement social, 전국사회주택감독기관)
ANCOLS는 프랑스의 전국사회주택감독기관으로, 사회주택 공급자에 대한 법적 규제 준수 여부와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감시하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임대주택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6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13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입니다. 이 중 약 90명은 감사 전담 인력으로, 각 사회임대인의 거버넌스 구조, 임대료 책정의 적절성, 지역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 여부, 주거지의 관리·유지·보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ANCOLS의 전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치된 감독기관들로, 이후 조직 개편을 거쳐 2015년에 현재의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주택부 대표 2인, 경제·재정부 대표 2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 3인(인사·회계·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자)으로 구성됩니다.
ANCOLS에서는 세르주 보시니(Serge Bossini) 사무총장과 마튀 루오(Mathieu Rouault) 홍보·대외협력 책임관 등 3명의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ANCOLS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여,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답변 두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사회임대주택 공급자가 실제로 해산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NCOLS 측은 매년 약 100여 건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 중 실제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는 연 5~6건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운영기관은 예비보고서 단계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주거부에 해당 기관의 해산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이후에 시정 기회가 보장되는 구조와 함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운영기관이 스스로 타 사회임대인과의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법적 해산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 현장에는 평균적으로 약 1만 호의 주택을 보유한 공급자에 대해 두 명의 감사관이 3개월가량 파견되며, 전체 감사 과정은 예비보고서, 시정 기간,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약 1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ANCOLS의 재정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주택 임대인들이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을 감독하는 기관이 임대인들에 의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자, 보시니 사무총장은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오히려 감독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임대인들은 주택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 분담금은 ‘보증기금’(fonds de garantie) 성격으로 운영되며, 이 기금은 운영기관이 파산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인상 깊었던 방문이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국내 현실에서, ANCOLS의 사례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COLS 측에서도 한국에서의 첫 방문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었습니다.

5. 둘째 날 (2. 20.) 오후 : Paris Habitat(파리 아비타, 사회주택 공기업)
Paris Habitat는 프랑스 최대의 공공 사회주택 공급기관이자, 파리 시의 대표적인 사회주택 운영 주체입니다. 1914년에 설립되었고, 비영리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약 12만 6천 호의 사회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90%는 파리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파리 사회주택의 약 50%를 Paris Habitat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 9명 중 1명은 Paris Habitat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상깊었던 내용을 4가지 정도 추려보면, 첫째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Paris Habitat는 전적으로 공공 목적에 기반한 비영리 구조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다시 사회주택의 건설·개보수·관리 등으로 재투자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예금공사(Caisse des Dépôts)의 규제 대출, 국가지원 보조금, 그리고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구조 덕분에 자본시장 논리와는 구별되는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우선매수권(선매권) 제도의 운용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파리 시청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이후 해당 물건을 일정 기간(예: 60년) 동안 사회주택 용도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Paris Habitat에 임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격 산정은 주위 토지세와 중앙정부 기준을 반영해 공시가격에 준해 이루어지며, 매도인은 통보를 받은 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파리시가 시세에 가깝게 후하게 보상하고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신규 택지 확보가 극히 제한된 파리시에서 사회주택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주택의 ‘주거 순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규 공급 여건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내 거주자들의 순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가 주요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자녀 양육을 마친 뒤에도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비효율성과 대기자 증가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 개정에 따라, 65세 미만 세대 등 거주자에 대해서 1~3차례의 대체 주택 제안을 하고, 이를 모두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강제 이주는 불가능하며, 그 대신 더 작은 평형의 주택과 이사 비용 지원,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설득과 협상의 방식으로 주거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사회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료 구조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주택이 지어질 때 미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직전에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공 보조금과 낮은 금리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의 주거지원금 제도를 통해 제곱미터당 18.89유로의 고임대료 구간(PLI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에 저소득층 입주자가 거주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는 Paris Habitat의 사회주택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뤼이 병영(Caserne de Reuilly)’은 19세기 군사시설에 대하여 파리시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한 뒤 Paris Habitat에 넘겨 사회주택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총 582세대 중 절반 이상을 사회주택(가족용과 학생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는 중간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30%는 임대료 상한이 적용된 일반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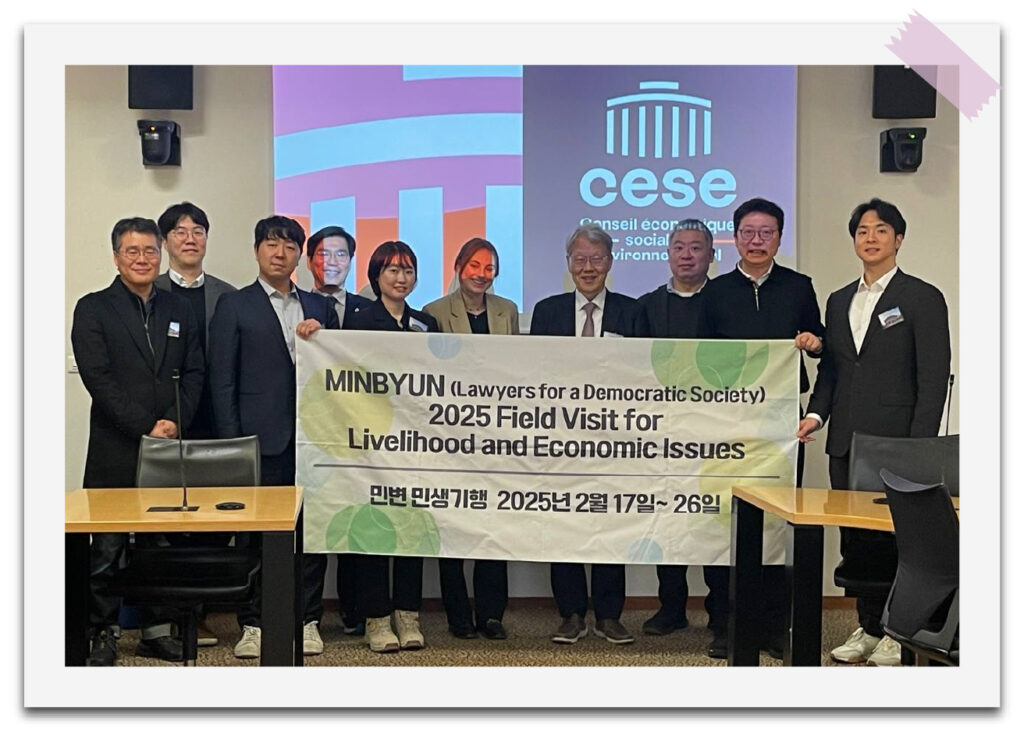
6. 셋째 날 (2. 21.) 오전 : CESE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는 프랑스 헌법상 제3의 국가기관으로, 정부와 의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노동계, 기업계,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 다양한 사회·직능 단체의 대표들로 선출된 1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사회·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와 의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 기능, 둘째, 정책의 실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 셋째,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 정당성 제고, 넷째, 유럽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적 연대입니다. 또한, CESE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프랑스의 지역 단위 자문기구(CESER)와도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CESE에서는 베르트랑 클뤼젤(Bertrand Cluzel) 전 CESE 위원, 현 대외협력 담당자가 청사를 안내해주었고, 로르 말레(Laure Mallet) 대외협력과 실무관과 아스트리드 올네트(Astrid Aulnette) 유럽 및 국제관계국 책임관이 CESE의 조직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 셋째 날 (2. 21.) 오후 : USH (Union sociale pour l’habitat, 프랑스 사회주택 공급 연합기관)
USH는 프랑스 전역의 사회주택 공급자들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연합조직입니다. 즉, ① 공공주택기관(Offices publics de l’habitat, OPH), ② 사회적 임대기업(Entreprises sociales pour l’habitat, ESH), ③ 협동조합형 임대주택(Coopératives Hlm), ④ 사회주택 분양 지원단체(Union d’économie sociale pour l’accession à la propriété, UESAP), ⑤ 지역별 연합을 통합하는 전국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régionales Hlm, FNAR) 등 총 다섯 분야에서의 각 연합체들이 다시 모여 구성된 상위 연합체입니다. 다만, USH는 이들 다섯 개 조직을 위에서 지휘하거나 명령하는 상위 기관은 아니고, 각 구성 단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연대하여 공동의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USH는 사회주택 정책의 입안, 정부에 대한 협상, 국제 교류, 회원 기관 교육 및 자료 배포, 법제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SH에서는 크리스토프 카뉴(Christophe Canu) 경제·재정 연구국 부국장(경제·재정연구실장)과 프루던스 아자노훈(Prudence Adjanohoun) 유럽·국제협력부 특별보좌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담당하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카뉴 부국장은 USH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으며, 프루던스 아자노훈 보좌관은 USH의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한편, 프랑스어권 국가의 사회주택 네트워크인 ‘주거 및 프랑코포니 연합(Réseau Habitat et Francophonie)’의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USH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는, ‘리브레 아(Livret A)’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 구조였습니다. 리브레 아는 1818년,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연합군에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보장 저축제도입니다. 이후 국민 저축을 기반으로 한 공공 목적 투자 수단으로 발전하여, 현재에는 프랑스인이 가장 선호하는 비과세 저축 계좌로 사회주택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브레 아 계좌에 예치된 국민들의 자금은 예금공사(Caisse des Dépôts, CDC)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되며, 사회주택 건설 및 개보수 자금으로 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회주택 공급자들은 민간 금융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대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CDC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을 수행하며, 이자율 또한 정부가 결정하므로, 시장금리의 급등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장기적인 금융·수익 구조를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 공급자들은 통상 40년에 이르는 장기 상환 대출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 사업의 수지를 설계하며, 건설비용·대출 상환·운영비·유지관리비·세금 등을 모두 반영하여 미래의 월세를 사전에 추정합니다. 이러한 장기 재정 시뮬레이션은 월세 수입이 지출을 얼마나 초과하거나 부족할지를 시계열 곡선으로 분석하고, 예상 적자 구간에 대비한 비축금 누적 또는 정책적 조정을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USH는 가장 유익한 방문기관이었습니다. 특히 리브레 아를 중심으로 예금공사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 구조가 구축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자들은 민간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통장인 반면, 프랑스는 국민적인 비과세 저축계좌를 통해 사회주택에 대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ost Views: 49